|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Sun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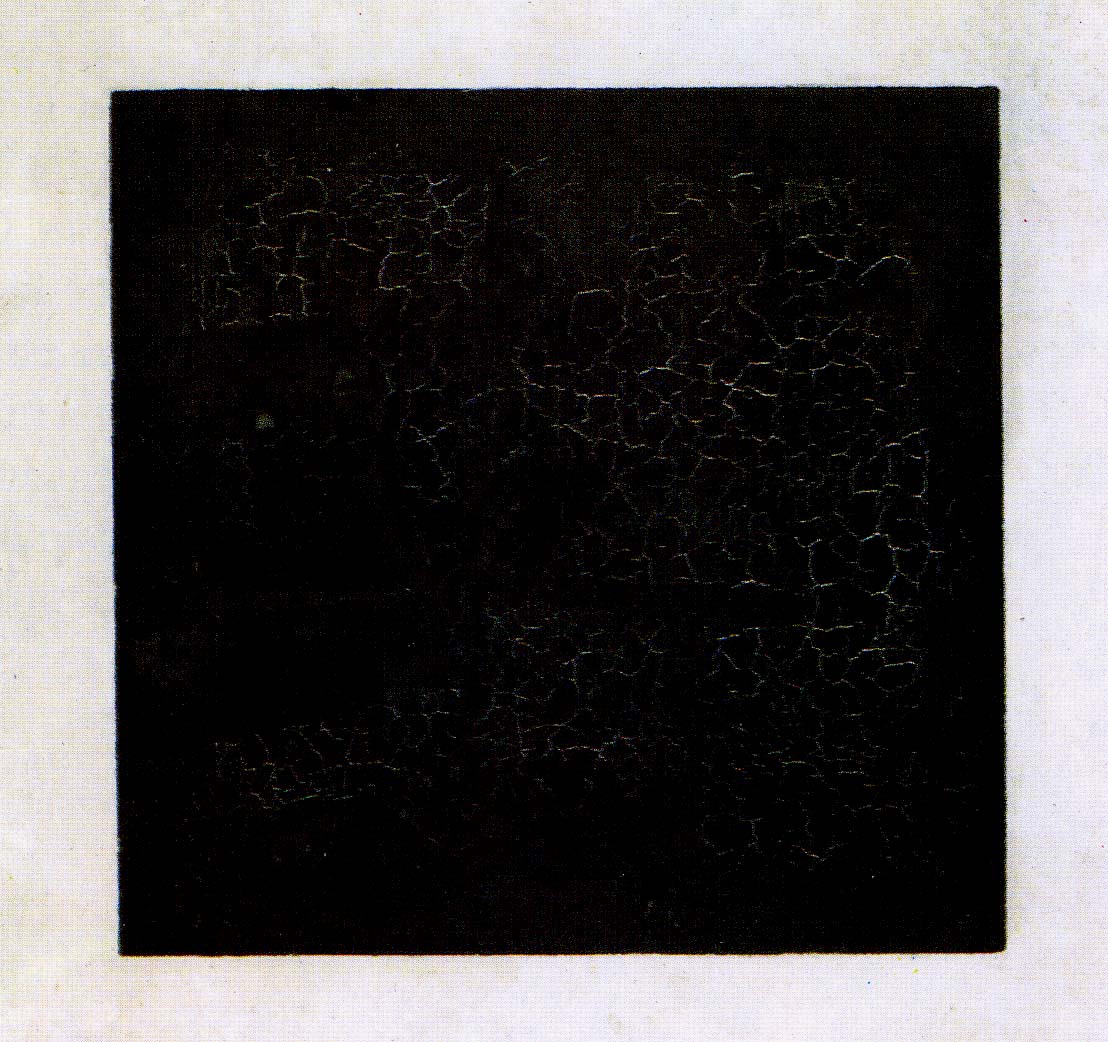
오후에는 문득, 내 몸에서 그 어떤 정리벽이 이처럼 돋아났다. 그러자 나는 새로 나는 이가 너무나도 간지러워서 참을 수 없는 것처럼, 갑자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졌다. 나는 책상위에 뭔가를 자꾸 다 펼쳤다가, 또 철수하기를 반복했다. '헤쳐 모여.' 와 같은 내안의 구령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벌써 예전에 만들어 놓은 대열들이, 몇번씩 서로 번갈아가며 자리를 바꿨다. 네 자리와 내 자리 모두, 우리 사이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었지만, 어쨌거나 시간은 갔다.
잇몸을 살살 긁는듯한 간지러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됐다. 알바에 출근해서 나는 갑자기 주방 정리를 시작했고, 먼지가 뽀얗게 앉은 빈 와인병들을 죄 물로 닦았다가, 구석구석에 아무렇게나 쳐박힌 것들을 다 꺼내기 시작했다. 차곡차곡, 내것이 아닌 것들은 손쉽게 정리되어 손쉽게 버려졌다. 뭔가를 버리는 것은, 묘한 쾌감을 준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벽은 더욱 단단히 뿌리를 내렸다. 나는 가게 문을 닫는 순간까지 끝없이 뭔가를 정리했다. 새벽 한시반, 집에 돌아와서도 정리벽은 계속 되었다. 나는 집에 있는 것들을 꺼내고, 펼치고, 뜯고, 찢어서, 쓰레기통에 밀어넣었다. 내 방안에서는 이따금씩 빈 쌍화탕병이나, 사진, 음식물의 포장지, 쪽지의 낙서같은 것들이 어떤 민족의 고대 유물처럼 발견되었다. 눈이 무거운 이유가, 아직도 버릴 수 없는 물건들 때문인지, 졸린 까닭인지 알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시간은 아침을 앞두고 있었다. 온종일 나는 많은 것을 버렸지만, 또 많은 것을 버리지 못했다. 다만 내것은 아무것도 버릴 수가 없었다. 다만 네것도, 나는 아무것도 버릴 수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