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Sun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30 | 3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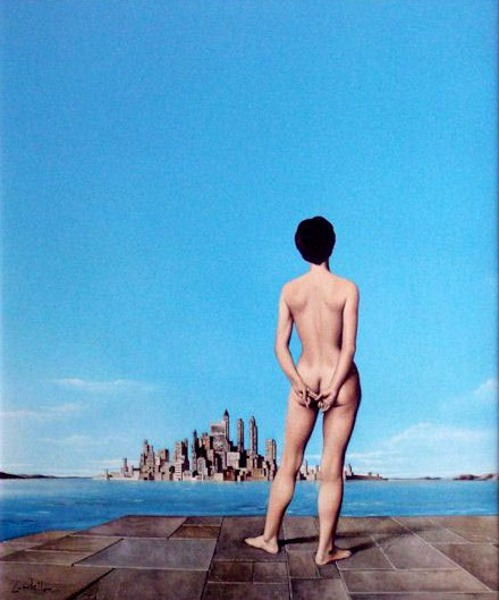
나는 어렸을 때부터, 줄긋기에 소질이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빈종이에 표를 그리거나 그래프를 그리는 일을, 정말 정말 못했다. 누구보다 반듯하고 싶었지만, 손을 떼면 어느 쪽은 반드시 기울어져 있었다. 어딘가 비뚤어지거나, 엇나간 선을 볼 때마다 똑바르게 살지 못한 내가 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몇 번을 다시 그어도, 나는 기울기만 했다.
스무살에 경영학도가 되었을 때, 나는 필기 노트에 표와 그래프들이 난무하는 아주 그럴싸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내 꿈은 아주 그럴듯하게 망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선을 긋는 것에도 소질이 없었고, 단지 소질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이해력까지 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기 때문이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도표화 된 사실들을 남들과 똑같이 눈 앞에 두고도 나는 두 눈이 모자랐다. 선을 그리지 않고 풀어쓰던 습관들이 온몸에 굳은살처럼 박혀있었다. 나는 무언가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글자들이 필요로 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한 눈에 누군가를 알아보고 나를 말렸다. 하지만 나는 또 두 눈이 모자랐다. 사람을 완전히 알아보는 일에도, 사람을 이해하는 일에도, 내게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나만 아는 문장들이 필요했다. 어쩌면 나는 너를, 내가 아는 언어로 풀어쓰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표와 그래프로 도배된 과목들이 늘어날수록, 내 기울기는 더욱 더 진행됐다. 나는 기운 달처럼, 때가 되도 다시 차오르지 않았다. 나는 날로 더 기울기만 했다.
이미 기울대로 기울어진 나는, 그래서 관계에서 자주 삐딱선을 탔다. 우리의 관계가 비뚤어질 때면, 바로 잡고 싶었던 내가 다시 무수히 많은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전히 내게는 소질이 없다. 몇 번을 다시 그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긋나고 빗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