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Sun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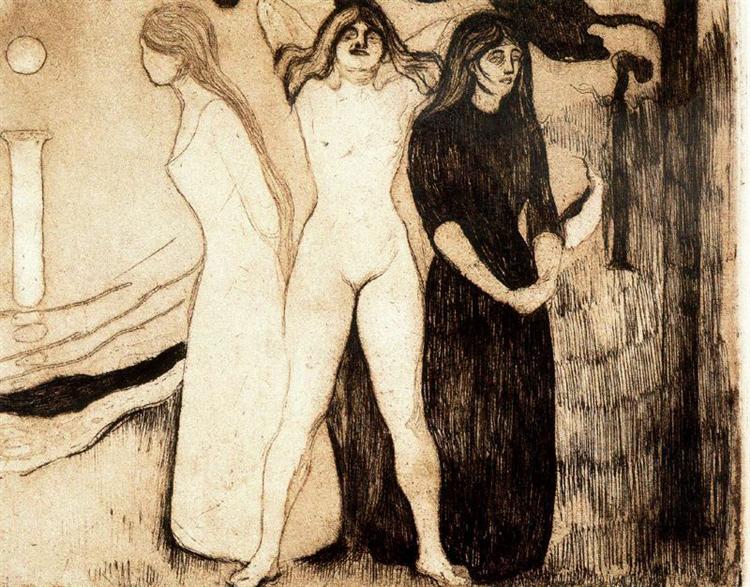
주말 동안 내내 바빴다. 집에 좋아하는 동생이 놀러 오는 바람에 손님치레를 했을 뿐인데, 주말이 다 갔다. 수요일에 백신을 맞고, 컨디션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던 것 같다. 이번에는 요리도 안 하고 집 정리도 하지 않았는데, 체력이 방전되어 집에 놀러 온 손님을 집에 두고 제일 먼저 잠들었다.
그날 새벽에는 갑자기 몸에 열이 났다가 내렸다가 했다. 너무 몸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져 자다가 옷을 벗었다. 그러다 너무 추워서 깨고, 다시 열이 나서 깨고, 추워서 깨기를 새벽 내내 반복했다. 이런 게 갱년기인가, 빠르면 십몇 년 안에 다가올 미래가 걱정되는 기분이 들었다.
며칠은 쉬고 싶어져 일기를 쓰지 않았더니 고작 며칠 쉬었다고 키보드가 낯설다. 하고 싶은 말들은 사실 많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아직도 내 안에 너무 많은 말이 있다. 꺼내도 꺼내도 말이 줄어드는 것 같지 않다. 나는 얼마나 많은 말들을 내 안에 가두고 살아온 걸까. 나는 가끔 내 속이 가엾다.
올해 들어 새롭게 누군가를 알게 되고, 새로운 관계들이 생겨나고, 사실은 벌써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다. 나이가 들어도 인간관계는 왜 늘 이렇게 이토록 어려운 걸까. 나는 관계를 맺는 일에 늘 언제나 서투른 사람인 것 같다. 이토록 서투른 사람이라서, 서둘러 누군가와 친해지는 일을 늘 두려워한다. 용기 내는 일은 언제나 어렵다. 그래서 용기 내고 싶지 않은 마음과, 용기 내야 하는 마음과, 매일 그 어떤 마음이 충돌한다.




